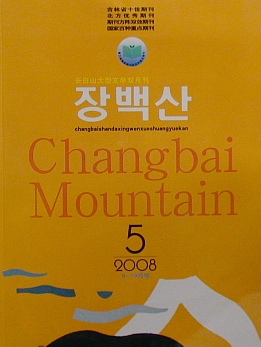▶[문단화제]연길 심예란시인,「장백산」2008년 5기 '시와 시평'특집 화제!
▶[문단화제]연길 심예란시인,「장백산」2008년 5기 '시와 시평'특집 화제!!
2008년 연변지용문학상을 수상해 시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나가고 있는
연길 심예란시인이 최고 권위의 중국 조선족 대형문예잡지「장백산」(총편 남영전시인)
2008년 5기(루계161)에 <시와 시평>란 특집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정서와 민족정서, 그리고 문명된 사회에 대한 정황을 투시하며,
시대를 살아가는 객관적 상관물에 대한 인식이 새롭고 남다른 신선한 상상력으로 빚어내는
탄탄한 문장구사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아왔다.
◆ 한국 서지월 시인 - 연길 심예란 시인.
심예란 시 '산' 외 9수와 한국 서지월 서지월시인이 집필한
심예란 시평론 <肉化된 情緖의 詩>가 전재수록돼 더욱 무게를 더하고 있다.
◇ ◇ ◇ ◇ ◇
심예란시인의 시를 접하면서, 나는 만주땅 연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의 삶의 숨결을 나름대로 훈훈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시가 갖는 형식미도 형식미이지만 중년 조선족 여성의 시정신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매력을 갖게 된 것이다.
먼저, 시 <두만강>를 보자.
허리 굽은 두만강이
구겨진 옛말을 다듬질하는 소리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
천지가 드리운 흰 수염은
태초의 할아버지
각이 삐뚤어진 력사를
애써 맞추며
건정건정 걸어온다
ㅡ시 <두만강>전문.
이 시가 아주 밀도 있게 다가오는 것은 쉽게 씌여진 게 아니라는데 있다. 시가 갖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비유와 상징이 적절히 잘 배합되는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허리 굽은 두만강'에서 ''허리 굽은' 의 의미라든지 '구겨진 옛말을 다듬질하는 소리', '아리랑 고개를 넘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민족정서를 잘 구현하고 있는 대목으로 보여지는데 '구겨진 옛말'은 애환 많은 삶일 것이며, '다듬질하는 소리'는 인내로 추스린다는 뜻 아니겠는가. '아리랑 고개' 역시 쓰리고 아린 애환의 정서인 것이다. 이런 이미지들이 두만강으로 잘 의미화 하고 있는 것이다.
천지의 폭포 역시 '흰 수염은 태초의 할아버지'라 했는데. 이런 비유가 신선한 것은 두만강이나 천지를 느낀 대로 마구 읊는 형식이 아니라 의미화하는데 공헌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각이 삐뚤어진 력사'라는 표현이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데 순탄하지 않는 내력이며, '애써 맞추며 / 건정건정 걸어온다'에서도 풍겨져 나오는 것은 질긴 생명력의 총체적인 삶으로 두만강이 존재해 온 것이리라. 민족정서를 아주 함축적으로 노래한 한 작품으로 읽힌다.
손이 운다
가냘픈 어깨를 달싹이며
눈물을 떨군다
손톱눈 비집고 나온
푸른 베짱이
백양나무 그늘 쓰고
노래 부를 때
빈 오두막이
쓰러지는 소리로
손이 운다
울다가 울다가
열 손가락 개미발 되어
다시
긴다 긴다
ㅡ<손> 전문.
위의 <손>이라는 시에서는 놀라운 상상력을 발견할 수 있는데 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 역시 설움 내지는 애환 또는 헤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다. 눈물을 훔치며 서러운 이별을 많이 경험한 우리로서는 인간이 갖는 비애의 정서로 읽힌다. 그것을 시인은 눈물을 훔치는 행위인 손에 비유되어 더욱 실감을 자아내고 있다. 제1연의 눈물의 행위 표현에서 제2연에서는 배경이미지로 백양나무 그늘 아래 베짱이가 노래 부를 때라는, 아주 칼라풀한 정적 이미지가 깔리는 것이다.
한 편의 시가 울림이 크고 깊은 의미를 가지려면 그 자체의 정황만 가지고는 단순하게 흘려버릴 수 있다.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대목이 제3연이다. '빈 오두막이 / 쓰러지는 소리로 /손이 운다'고 했다. '빈 오두막이 / 쓰러지는 소리' 라는 이런 표현은 쉬이 끌어올 수 있는게 아니라 본다. 내용상으로 볼 때도 그만큼 처절한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미물인 <자벌레>를 노래한 시를 보자.
허리를 오무렸다 폈다하며
몸으로 꿈을 재는 자벌레
버드나무 삭정이에 목숨을 건다
자라처럼 움츠렸던 목을 천천히 빼들고
사위를 둘러보아도 눈앞이 아찔한 공중 줄타기
회오리 바람손에 목덜미 잡히면
여린 꿈은 땅에 떨어져 몇바퀴 뒹굴다가 다시 기여간다
청장공로(青藏公路)따라 오체투지하는
장족(藏族)사나이 몸짓이다
저 속도로 시간을 재였을 것이다
저 인내로 길도 재였을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또 헤여져서는
저렇게 땅에다 몸을 달구었을 것이다
그도 가죽 앞치마로 배와 무릎 가리웠을 것이다
나무장갑을 끼고 손으로 땅을 딛는 초원의 생명
갓 돋아나는 꽃잎의 욕망을 재느라
발끝 무릎 가슴 이마에 피를 묻힌다
길 없는 길을 만들어 간다
맨 가슴을 땅에 부벼대고 싶어
제 몸을 허물어 가시밭길 만든다
삶과 죽음은 수레바퀴처럼 련결 되여
줄 우와 아래를 넘나들며
모든 생명을 유혹한다
더 오랜세월이 흘러
땡볓 아래 몇줌 모래알로 번식되여도
두 손에 눈금을 꼭 쥔 채
삶을 재는 파아란 자대여!
ㅡ심예란 시 <자벌레 > 전문.
기어가는 자벌레의 모습과 장족의 오체투지를 통해 보여주는 세계는 무엇인가. 인간사 고행의 현실이 절실하게 와 닿는다고 할까. 미물인 자벌레를 통해서 또는 장족의 오체투지 그 힘든 고행을 통해서 모든 목숨 있는 것들의 끝이 어디인가를 암시해 준다. 행복을 추구하는게 인간 본연의 갈망이라 하지만 그건 변화무쌍의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에서는 번뇌와 고뇌 갈등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종교와 고행이 추구하는 것은 수행과 득도일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을 넘어선 세계에서 가능한 일, 살아가는 일도 시를 쓰는 일도 이와 같다면 틀린 말일까. 이 시를 통해서 심예란시인이 걸어가는 삶은 오체투지도 마다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이 번뜩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속 없는 찐빵이 맛 없듯이 심예란의 시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생활주변의 상(相)들을 생활주변 그대로 놓여있게 하는게 아니라 자신의 시혼(詩魂)으로 담궈어 내어 재구성해 하는 데 있다. 이처럼 한 편 한 편의 시가 퍼내는 심예란 시의 울림이 자신의 삶과 주변의 숨결과 대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말해주는 육화된 정서인 것이다.
**「장백산」2008년 5기(루계161)에 게재된 서지월시인의 심예란 시 평론 중에서 발췌.
◇ ◇ ◇ ◇ ◇